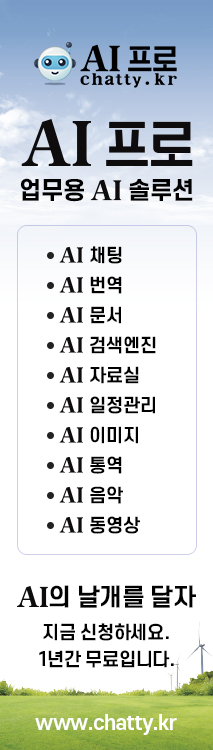미래학
미래학(未來學, 영어: futures studies/research, futurism, futurology)은 과거,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미래 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 추론하고 예측하여 그 모형(모델)을 제시하는 학문이다.[1]
개요[편집]
미래학은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미래학이 다른 학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래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실증(實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 말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현대인 사이에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불안의 원인은 근래의 두드러진 기술혁신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그로 인한 공해, 환경파괴 등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특별한 시간적 한계는 없으나, 편의적으로 현미래(現未來:10년), 근미래(近未來:10²년), 중미래(10³년), 원미래(10⁴년)와 같이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미래연구는 특히 선진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에서도 급속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미래 관계 연구단체가 있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미국의 2000년 위원회(사회학자 D.벨을 중심으로 한 과학예술아카데미 소속), 프랑스의 퓌튀리블(베르랑트 드 쥐브넬을 중심으로 한 미래학회), 영국의 2000년의 인류위원회 등이 있다.
미래학은 현실도피의 무책임한 엉터리 학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허망한 희망적 몽상을 미래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래학은 그렇듯 몽상적인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 속에서 미래사회를 시사(示唆)하는 변화의 조짐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학은 현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있는, 개연성 있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상정하고 이를 기저로 하는 세계관이나 신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예술인지 과학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한 갈래와 역사의 또다른 분야로 일컬어진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고, 미래학은 미래를 생각한다. 미래학은 무엇이 지속되기에 개연성이 있는지 또 무엇이 그럴싸하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보며 학문의 분야와 같이 체계적으로 보고 과거의 현재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미래의 사건과 트렌드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낸다. 좀 더 좁게, 더 명시적으로 연구되는 물리학과 다르게 미래학은 세계의 체계를 더 크게, 더 복잡하게 이해한다. 미래학 연구의 방법론과 지식은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과 비교하여 일부만 증명된다.[2]
특징[편집]
미래학은 미래사회의 예측이나 계획을 세우려 하는 부르주아 이론이다. 옛날부터 '지복(至福)의 미래'를 예언하고 대망하는 유토피아 사상이나 종말관(終末觀)이 있었다. 그러한 것이 신비적 비전이나 공상에 의해 신의 힘에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의 미래학은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과 과학의 예측능력에 의거하여 인간의 능력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전제에는 유물론적 역사관의 강력한 비판이 따른다.
즉 역사가 개인의 의욕이나 원망(願望)을 짓밟고 '철(鐵)의 자연법칙'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숙명론을 유물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 후, '고도 대중 소비 사회'의 현실을 일면적, 표면적으로 파악해 자본론에서 말하는 '빈곤화'의 예언이 잘못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현대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라 칭하면서 유물사관의 '종언'을 선언한다. 그리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무(無)이다. 신이나 역사법칙을 대신해서 인간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외친다.
이는 확실히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만,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전대(前代)에서 계속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제 조건에 기초해 제약당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의설(主意說)이며, 주관적 관념론에 불과하다. 그 객관적 역할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규모에 있어서의 이행이 현대의 주요내용이며 현대사의 기본적인 도정이라는 사실로부터 근로자의 눈을 돌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도 '지복의 미래'가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불러일으켜 근로자의 충성을 강요하려고 하는 바에 있다.[3]
미래학의 실체[편집]
미래학은 '예언'하는가[편집]
점쟁이는 생일이나 타로 카드, 별자리 같은 역술로 점을 의뢰한 사람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언은 미신이나 자기확신에 근거한 경우가 많지만, 미래학자의 예측은 외삽이다. 물론 외삽이 크게 엇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미래학이 학문이 아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년 뒤 GDP가 어떻게 될지 단언하는 경제학자는 사이비가 될 것인데, 미래학도 그러하다.
미래학자는 미래 사회와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가능한 여러 미래의 사회상을 발표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일을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는 경제학, 정치과학 등 다른 학자들의 몫이다. 미래학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고, 미래학도 거꾸로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을 갖는다.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에 대해 아는 경우는 드물고, 각 미래학자마다 전문되는 분야를 가지는 편이다. 현재 활동중인 미래학자들은 대부분 정치학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하였다.
일본 정부는 1971년부터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미래연구를 시작해 왔다. 영국 정부는 1999년부터 '2차 foresight program'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술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폭넓은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다.
미래학은 정확한가[편집]
미래학은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동향을 예상하는 것으로, 데이터 수집 능력, 분석 능력, 돌발이슈 관리 능력에 따라 예측의 정확성도 달라진다.
1982년에 예측한 2000년대 모습
- 맞는 것: 장수가족 급증, 안전성 문제로 연탄 금지하고 LNG 도시가스 사용, 5000만명에서 인구 정체, 화상전화, 집집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2천만대), 컴퓨터로 일정이나 통장잔고를 관리, 전기밥솥, 로봇청소기, 1가정 1컴퓨터, 컴퓨터가 자녀의 예습복습을 도와줌(인강), 컴퓨터로 백과사전 찾아보듯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인터넷 검색)
- 비관적으로 보아 틀린 것: 1인당 GNP 4,380달러, 화상전화가 고정형
- 낙관적으로 보아 틀린 것: 셋방살이를 안 해도 된다, 물건을 옮기는 가정용 로봇, AI 진료
-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규제나 편의성 문제로 시장 형성에 실패: 아침마다 컴퓨터로 메뉴를 전달받아 과학적인 조리를 한다, 원격진료
- 알 수 없음: 쾌적한 환경
미래학은 학문인가[편집]
이런 업무는 새로운게 아니다. 정부의 싱크 탱크, 기업의 전략기획 직무, 전략컨설팅 산업, 대학원 연구소 등 미래를 예측하여 돈을 버는 직업은 항상 존재했다. 미래학자라는 용어의 사용 실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예측하는 학자들에게 언론에서 미래학자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정작 미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전공은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소비자학 등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에는 대표적으로 토마스 프레이, 앨빈 토플러, 레이 커즈와일, 미치오 카쿠, 제러미 리프킨, 자크 아탈리 등이 있다. 그 외에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를 자칭하기도 한다.
미래학은 기존에 마케팅, 경제학, 공학, 자연과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성립가능한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존재하며, 통일된 의견은 없다.
단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과학, 기술, 공학적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 AI로 인해 변화하는 생활패턴과 일자리 구조변화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선 1,2,3차 산업혁명에 비해 산업구조나 일자리 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스스로를 미래학자로 칭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스스로 미래학자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이비 점쟁이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바닥에서는 순환 논법도 심심찮게 쓰인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위키원
위키원